지독하지만 참아내야 할 헬기 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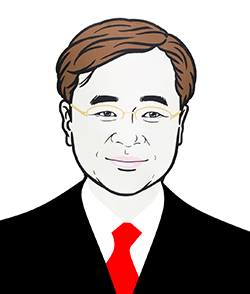
어느 신문에 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호주 출신 외국인이 ‘닥터헬기 소음은 생명의 소리’라고 쓴 글을 읽고 전적으로 공감했다. 아마도 닥터헬기의 이착륙 소음으로 고통받는 민원이 빗발치는 현실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다. “일상에서 고요를 누리면서 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불가피한 닥터헬기의 소음을 참아내야 한다”는 요지다.
맞다. 전국에 군(郡) 가운데 응급실이 없는 곳이 5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닥터헬기는 즉시 출동해야 한다. 밤낮의 문제가 아니다.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다 배에 총알 5발을 맞은 오청성 병사는 마침 옆에 있던 미군 닥터헬기로 22 분만에 이국종 교수 수술대에 오른 덕분에 살아났다. 천운처럼 목숨을 건진 것에 비하면 소음이 문제가 아니다.
헬기 소음은 ‘구원의 소리’다.
닥터헬기에 관해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교수가 다소 엉뚱하기(?) 조차한 ‘재판 탄원서’까지 내면서 선처를 호소했겠는가.
헬기 소음으로 여주도 몸살을 앓는다. 하지만 미군헬기 훈련장이 있는 비내섬(충주시 앙성면)에 비하면 약과다. 비내섬에 맞붙어 사는 우리 집 지붕 위로는 매주 수, 목요일 저녁이 되면 미군헬기의 ‘야간 비행훈련’이 시작된다. 그 소음을 몇 데시벨로 잰다는 것이 무용할 정도로 시끄럽다. 이 정도면 조천리 마을 사람들이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데모라도 할 판인데 놀랍게도 조용하다.
노인들만 몰려 사는 마을이라 동네 어르신께 여쭤보았다.
“이렇게 헬기 훈련하는 소리로 시끄러운데 괜찮아요?”
“시끄럽기야 하지. 그렇다고 우리 동네서 쫓아낸다고 해결이 되나? 그럼 훈련은 어디 가서 해?” 맞다. 그게 정답이다.
그 말을 듣고부터 참 희한하게도 헬기 소리가 훨씬 부드럽게 들려왔다. 때로는 정겹게 들리기조차 하는듯하다.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리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 하지만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국가안보의 전선에서 미군의 존재는 동맹의 틀 위에서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원군’이다. 국가안보에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는가. 돈을 기준으로 세계를 계산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진원지로 하여 솔솔 분다는 ‘주한미군철수’카드라는 말에 가슴이 섬뜩해진다. 주한미군 철수가 눈앞의 현실이 된다면 터키의 공격에 쫓기는 쿠르드족 신세가 도무지 남의 일 같지 않아 걱정이다.
사격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이착륙 훈련조차 성원은 못 해줄망정 구박해서 내몬다면 미군도 ‘대한민국 땅’에 더더욱 정나미가 떨어질 것 아니겠는가.
지금은 누가 치워버렸는지 없어졌지만 “비내섬에서 훈련시간을 엄수하라”는 경고성 플래카드가 붙은 적이 있다. 그 문구가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여기서 훈련하지 말고 떠나라”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소음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의 소박한 저항 같아 오히려 고마웠다.
그러고 보니 ‘국제연합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때 공휴일로 정해 기렸던, 잊혀진 기념일 ‘유엔데이’가 쓸쓸하게 지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