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걸린 어머니는 나를 몰라봐도 나는 어머니를 알지 않는가”
친구의 한 마디 속에 담긴 진정한 효의 의미, 가슴에 새겨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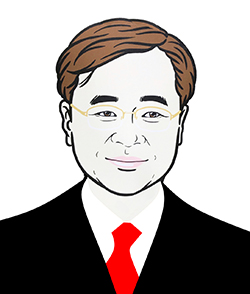
“애비야, 그 친구들이 또 다녀갔다. 고맙지 뭐냐, 꼭 인사해라.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냐.”
추석이 다가오니 내 친구 둘이 이천에 있는 민간 양로원에 계시는 아흔한 살 우리 어머니를 뵈러 왔다 간 거였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명절마다 일부러 찾아오다니, 제 부모도 귀찮아하는 세상에 고맙기는 하기만 여간 면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번도 친구들은 우리 어머니께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자신들이 먼저 하지 않았다.
“친구야, 울 엄니한테 또 다녀 왔다면서? 이제 좀 그만해. 자네들 마음 잘 아는데 뭐...”
“응~, 근데 작년하고 올 다르시더라. 많이 쇠약해지셨어. 그래도 정신이 또렷하시니 얼마나 다행이냐?” 친구는 그저 딴소리로 답을 때운다.
가까이 있어도 제대로 못 찾아뵙는 이 아들에 비하면 얼마나 큰 ‘마을 씀씀이’ 인가.
사실 친구는 효자다. 아흔셋의 어머니를 3년 전까지 집에서 모시다가 도저히 치매를 견딜 수 없어 전문병원에 모셔다 놓고는 혼자 울던 아들이었다. 처음에는 하루 두 번씩 찾아가 병원이 귀찮아할 정도였다. 여든여덟의 어머니를 암 수술을 해 드리고, 지난달에는 5년이 지난 어머니가 다른 곳에 혹시 전이되었을지 몰라 정밀검사를 위해 큰 병원을 모시고 다녀왔다.
지금도 한 주일에 사흘은 어머니를 들여다보며 병원 문턱을 드나든다. 누구는 참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그의 효성은 지극하다. 내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말았다.
“친구야, 아들 얼굴도 몰라보는 어머니를 왜 그렇게 하루건너 찾아뵙는거야? 힘들지 않아?
”물론 힘들지. 하지만 울 어머니는 나를 몰라봐도 나는 울 어머니를 알잖아. 어떡해?“ 친구를 위로한다고 한 말이었지만 가슴에 콱 들어와 박히는 한 마디였다.
그렇다. ”어머니가 나를 몰라봐도 나는 어머니를 알잖아.“ 그보다 효(孝)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가 어디 있겠는가. 태국의 북부도시 창마이로 이주해 노년을 보내겠다고 답사까지 다 마친 그의 계획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올스톱이다.
또 한 친구는 얼마 전 내게 휴대폰에 스캔해 놓은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미 일흔을 바라보는 그가 초등학교(국민학교) 시절 사진 속 그의 옷은 몸이 웃자라 소매가 깡뚱해진 무명옷이었다. 헤진 곳을 덧대어 기운 곳이 여러 군데인 낡은 옷은 그의 소년 시절 곤궁을 말해주었다. 어머니 따라 장터까지 호박을 지게에 지고 간 뒤 얻어먹은 ‘십리 사탕’이 녹아 없어질까봐 빨다 말고 신문지에 몇 번이나 싸고 풀던 그였다. 삼십리 길 유혹에도 동생들 것은 고이 전해주던 오라비가 내 친구다.
10남매를 낳고 새끼들 숟가락 빠는 것에 한이 맺힌 어머니 차지는 부뚜막에서 대충 때우던 바가지 속 곱살미 보리 비빔밥 한 술이었다. 지금은 그나마 사업에도 성공하여 먹고 살만해졌지만 형제들 몇은 세상을 떠나고 없다. 그리운 추억 저 너머에 늘 꼬질꼬질한 수건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잠들어 계신 어머니는 이제 얼굴조차 가물가물하다. 가난밖에 물려준 것이 없어도 그 결핍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어머니, 한 땀 한 땀 헝겊을 덧대 기운 바지에는 그를 일으켜 세운 힘이 담겨 있었다.
이런 친구들에게 어찌 감사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가 인생의 선반 위에 올려놓은 물건을 찾으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업드려 내 등을 발판으로 내어주리라.
이제 추석을 맞아 고향마을 어귀에는 ”고향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내걸린다. 고향을 지킨 친구들이 내건 반가운 깃발이다.
고향을 떠나 제 살길로 떠났다 돌아오는 친구들을 쑥스러워하면서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그들이다. 대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처로 유학을 떠나지 못했지만 평생 물려받은 논밭전지 일구면서 고목처럼 늙어가는 우리 부모님까지 지켜준 친구들이다.
아침나절에 들판으로 나가다가 만나는 우리 부모님의 삭정이 같은 손을 잡아주며 건강을, 안부를 물어봐 준 것도 그들이다. 농협 공과금 심부름도,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울 때도 아들 대신 곁에서 도와준 바로 고향의 동무들이다. 올 추석에는 얼굴이 그을린 친구들에게 ”고향을 지켜주어 고맙다. 자네 덕에 우리가 타향에서 잘 살 수 있었네“라고 밥 한 끼, 술 한잔 사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