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저녁이 있는 삶’ 만큼이나 멋지지만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먼저’ 아닌가.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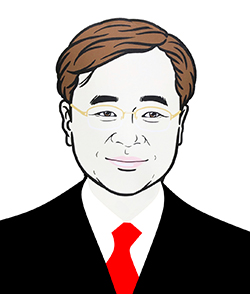
끈질긴 계몽과 단속 결과, 스쿨존에서 ‘30km 준수’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며칠 전 어느 초등학교 앞을 지나오면서 눈에 들어오는 표어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 가운데 걸작에 속하는 간명한 캐치프레이즈다.
줄여 말하자면 ‘인본주의’를 뜻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이 살자고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그 어떤 나머지 가치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철학적 성찰의 경구(警句)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이 먼저다’는 말은 병아리의 색깔에서 비롯된 노란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어린이에 주목하게 한다. 무조건 길을 건널 때 고사리손부터 들고 건너가는 습관을 배운 어린이들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훈시인 점에서 총론은 맞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정말 ‘사람이 먼저인가?’
혹시라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감안해야 하지만 ‘신호가 먼저 아닌가?“
신호는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생명을 위한 철칙이다.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서고, 초록불에 건너가는 신호의 규칙을 배운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알아들어 무조건 손만 들고 건너간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가.
아무리 대통령이 한 멋진 말이라도 붙여야 할 위치가 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울리는 문구는 아니다.
’신호가 먼저다‘
몇 년 전 한 야당 대표가 ’저녁이 있는 삶‘이란 말을 꺼냈을 때, 나는 그 절묘한 표현에 감동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사람이 먼저다‘는 말의 좀 더 구체적인 명제다.
밤을 새워가면서,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을 해야 했던 보통사람들의 고통을 콕 집어서 치유해 주겠다는 복음으로 들렸었다. 그러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주52 시간 근무‘를 강행하고, 위반하면 권고가 아닌 획일화된 처벌이 죄어온다. 정부는 큰 틀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여백으로 남겨주어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탄력근무다. 밤을 새워가면서 머리를 쥐어짜며 일을 해야 하는 ’창조형 사람‘에게 ”불 끄고 이제 그만 퇴근하자“는 건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탁자 대여섯 개 놓고 하는 백반집도 8순의 시아버지가 서빙을 해야 하는 ’고달픈 저녁‘으로 변해간다. 일을 줄이니 지갑이 얇아져 저녁을 즐기기는커녕 ’멀뚱한 저녁‘이 되는 집도 생겨난다.
’사람이 먼저‘라며 규칙적으로 작동되던 신호기를 교통경찰이 수동으로 조작(操作)하는 순간 ’큰 길에 선 사람‘은 빨리 가지만 나머지의 ’이면도로의 사람‘은 올스톱이다. 수동조작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시내 교통은 전체적으로 엉겨버린다. 평소 30분이면 통과하던 도심 구간이 두어 시간 걸리면서 퇴근길 ’저녁이 있는 삶‘은 반토막 난다.
경제의 흐름도 교통의 흐름과 같다. 상습정체구역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서 자동신호 주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주고는 기다려야 한다. 조급증을 느껴서 내 손안에 있는 수동조작 버튼을 누르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눈앞의 사거리만 보면서 우선 통행을 고집하면 ’어떤 사람이 먼저‘라는 설정에 치여버려 ’나중이 되어 버린 사람들‘ 다수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거리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하염없이 배고픈 ’공회전‘을 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